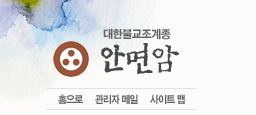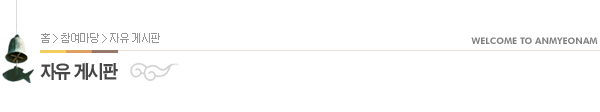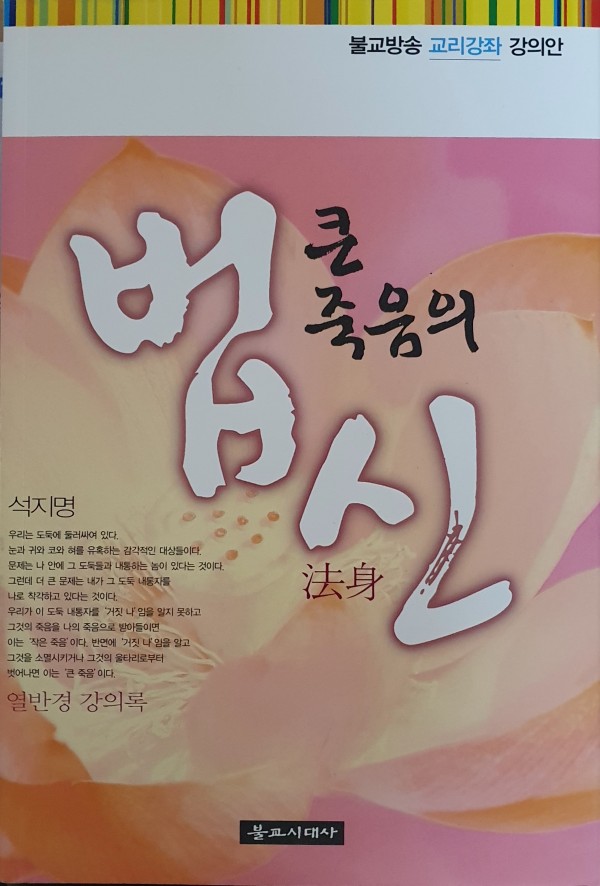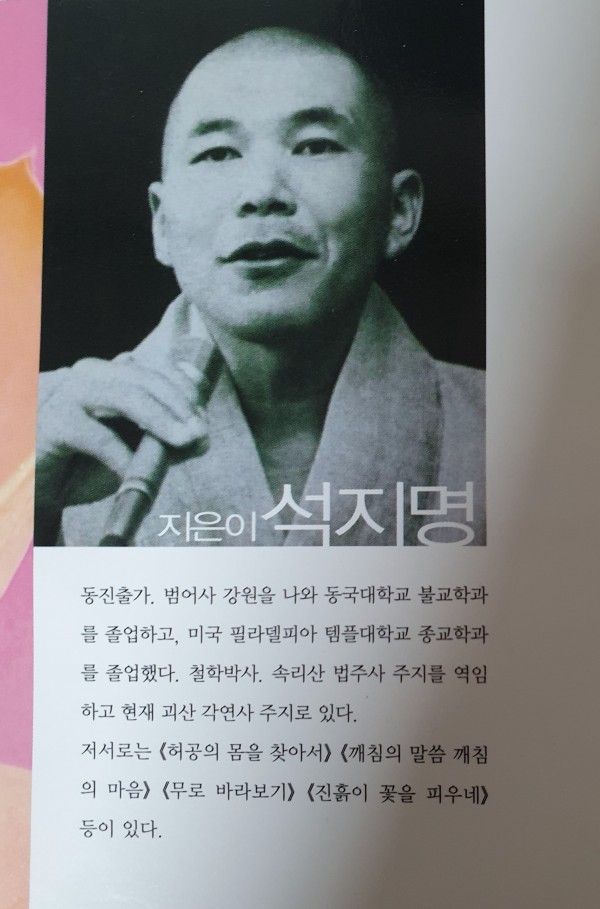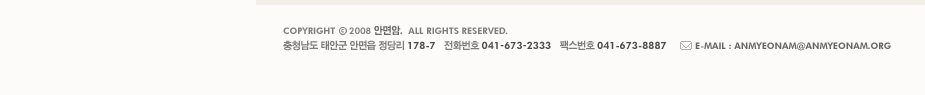{ м„Өлҙү мҠӨлӢҳмқҳ м•Ҳл©ҙм•” мқјкё° } : 82. к№ЁлӢ«м§Җ лӘ»н•ҳкі к№ЁлӢ¬м•ҳлӢӨкі н•ҳлҠ” л°”лқјмқҙ мЈ„(мӮ¬лһ‘мқ„ кІғ) 4
нҺҳмқҙм§Җ м •ліҙ
мһ‘м„ұмһҗ н•ҙнғҲмӢ¬кІҢмӢңлҙүмӮ¬ лҢ“кёҖ 2кұҙ мЎ°нҡҢ 177нҡҢ мһ‘м„ұмқј 25-01-10 08:41ліёл¬ё
В
82. к№ЁлӢ«м§Җ лӘ»н•ҳкі к№ЁлӢ¬м•ҳлӢӨкі н•ҳлҠ” л°”лқјмқҙ мЈ„(мӮ¬м •н’Ҳ 2) 4
В
В В мҳӣ м„ мӮ¬л“Өм—җ кҙҖн•ң мқҙм•јкё° к°ҖмҡҙлҚ°лҠ” нҒ¬кі мһ‘мқҖ к№ЁлӢ¬мқҢмқ„ м–»м—ҲлӢӨлҠ” л§җмқҙ мһҗмЈј лӮҳмҳЁлӢӨ. мҠӨлӢҳм—җ л”°лқјм„ң н•ң лІҲмқҳ нҷ•мІ лҢҖмҳӨлҸ„ мһҲкі , 1м°Ё к№ЁлӢ¬мқҢмқҙлӮҳ 2м°Ё к№ЁлӢ¬мқҢмқҙ мһҲлҠ”к°Җ н•ҳл©ҙ лҳҗ 3м°Ё к№ЁлӢ¬мқҢк№Ңм§ҖлҸ„ мһҲлӢӨ. мҳӣ м„ мӮ¬л“Өмқҳ н–үм Ғмқ„ мқҪмқ„ л•Ңл§ҲлӢӨ мқҙлҹ° мқҳл¬ёмқ„ к°Җм ё ліёлӢӨ. мҷң мҳҲм „м—җлҠ” мҠӨлӢҳл“Ө мқҙ к№ЁлӢ¬мқҢмқ„ м–»кё°к°Җ мү¬мӣ лҠ”лҚ° мҡ”мҰҳм—җлҠ” к№ЁлӢ¬мқҢмқ„ м–»м—ҲлӢӨкі л§җн•ҳлҠ” мҠӨлӢҳл“Өмқҙ л§Һм§Җ м•ҠлҠҗлғҗлҠ” кІғмқҙлӢӨ. л¶ҲкІҪм—җ ліҙл©ҙ л¶ҖмІҳлӢҳмқҳ м„ӨлІ• мһҘмҶҢм—җ лӘЁмқё лҢҖмӨ‘л“Өмқҙ л¶ҖмІҳлӢҳмқҳ лІ•л¬ёмқ„ л“ЈлҠ” мһҗлҰ¬м—җм„ң нҒ° к№ЁлӢ¬мқҢмқ„ м–»м—ҲлӢӨкі л¬ҳмӮ¬н•ҳлҠ” кІҪмҡ°к°Җ л§ҺлӢӨ. мөңк·јм—җ м—ҙл°ҳн•ҳмӢ нҒ°мҠӨлӢҳл“Өмқҳ н–үм Ғм—җм„ңлҸ„ 'н•ң мҶҢмӢқ'мқҙлқјл“ м§Җ м–ҙл–Ө 'кІ¬мІҳ(иҰӢиҷ•)'к°Җ мһҲм—ҲлӢӨлҠ” л§җл“Өмқ„ нқ”нһҲ ліј мҲҳ мһҲлӢӨ. к·ё мҠӨлӢҳл„Өл“ӨмқҖ 20~30лҢҖм—җ лІҢмҚЁ мғҒлӢ№н•ң к№ЁлӢ¬мқҢмқ„ м–»мқҖ кІғмңјлЎң л¬ҳмӮ¬лҗҳм–ҙ мһҲлӢӨ. к·ёлҹ°лҚ° нҳ„мһ¬ 50~60лҢҖ мқҙнӣ„мқҳ мҠӨлӢҳл„Өл“ӨмқҖ мҷң к№ЁлӢ¬мқҢмқ„
м–»м—ҲлӢӨкі кіөмӢқмңјлЎң л°ңн‘ңн•ҳлҠ” мқјмқҙ м—ҶлҠҗлғҗлҠ” л¬јмқҢмқҙлӢӨ.
В
В В м–ҙл–Ө мҠӨлӢҳмқҖ мқҙ мқҳл¬ём—җ лҢҖн•ң н•ҙлӢөмқ„ мқҙл ҮкІҢ м„ӨлӘ…н•ҳкё°лҸ„ н–ҲлӢӨ. мҳӣлӮ м—җлҠ” м •ліҙмқҳ м–‘мқҙ м Ғм—Ҳкё° л•Ңл¬ём—җ мӣ¬л§Ңн•ң к№ЁлӢ¬мқҢл§Ң м–»м–ҙлҸ„ к·ёкІғмқ„ мқј кҙҖлҗҳкІҢ мӢӨмІңн•ҳкі лҳҗ к·ё к№ЁлӢ¬мқҢмқҳ м •мӢ мқ„ м—°мһҘн•ҙм„ң л°Җкі лӮҳк°Җл©ҙ мӮ¬лһҢл“Өмқ„ м§ҖлҸ„н• мҲҳ мһҲм—Ҳм§Җл§Ң мҡ”мҰҳм—җлҠ” м •ліҙмқҳ м–‘мқҙ л„Ҳл¬ҙ л§Һм•„м„ң м•„мЈј нҒ° к№ЁлӢ¬мқҢмқ„ м–»м§Җ м•Ҡмңјл©ҙ мҶҢмҶҢн•ң к№ЁлӢ¬мқҢмқ„ к°Җм§Җкі лҠ” ліөмһЎн•ң нҳ„лҢҖмӮ¬нҡҢлҘј кө¬м ңн• мҲҳ м—ҶлӢӨлҠ” кІғмқҙлӢӨ. л”°лқјм„ң мҲҳн–үм—җ мқҳн•ҙм„ң мғҒлӢ№н•ң кІҪм§Җм—җ мқҙлЎ мҠӨлӢҳл„Өл“ӨлҸ„ к°ҖліҚкІҢ мһҗмӢ мқҳ к№ЁлӢ¬мқҢмқ„ л“ңлҹ¬лӮҙкұ°лӮҳ мһҗлһ‘н•ҳм§Җ м•ҠлҠ”лӢӨлҠ” кІғмқҙлӢӨ.
В
лҳҗ нҳ„лҢҖм—җ к№ЁлӢ¬мқҢмқ„ м–»м—ҲлӢӨкі мЈјмһҘн•ҳлҠ” мҲҳн–үмһҗк°Җ л§Һм§Җ м•ҠмқҖ мқҙмң лҘј нҳ„лҢҖмқҳ мӮ°л§Ңн•ң мҲҳн–ү н’ҚнҶ м—җм„ң м°ҫлҠ” 분лҸ„ мһҲлӢӨ. мҳҲм „м—җлҠ” мҲҳн–үмһҗл“Өмқҙ л§ҲмқҢмқ„ 집мӨ‘н•ҙм„ң кіөл¶Җн•ҳкё°к°Җ мўӢм•ҳлҠ”лҚ°, нҳ„лҢҖ мӮ°м—…мӮ¬нҡҢм—җлҠ” мӮ°м—җ нҳёлһ‘мқҙк°Җ м—Ҷм–ҙм§Ҳ м •лҸ„лЎң лӘЁл“ мӮ°л“Өмқҙ мӢңлҒ„лҹ¬мӣҢмЎҢлӢӨлҠ” кІғмқҙлӢӨ. мӮ¬лһҢл“Өмқҙ л“ұ мӮ°мқ„ л§Һмқҙ н•ҳкё° л•Ңл¬ём—җ мӮ°мқҙ мӢңлҒ„лҹ¬мӣҢмЎҢлӢӨлҠ” кІғмқҙ м•„лӢҲлқј мӮ°мҶҚм—җлҸ„ нҳ„лҢҖмқҳ л¬јм§Ҳл¬ёлӘ…мқҙ м№ЁнҲ¬н•ҙм„ң мқјмІҙмқҳ л¬јмҡ•мқ„ лІ„лҰ¬кІҢ н•ҳлҠ” к№ЁлӢ¬мқҢмқ„ м–»кё°к°Җ м җм җ лҚ” м–ҙл ӨмӣҢмЎҢлӢӨлҠ” кІғмқҙлӢӨ.
- мЈ„мҶЎн•©лӢҲлӢӨл§Ң, лӮҙмқј лҳҗ мқҙм–ҙ кІҢмӢңлҙүмӮ¬н•ҳкІ мҠөлӢҲлӢӨ.
В
- мқҙм „кёҖ{ м„Өлҙү мҠӨлӢҳмқҳ м•Ҳл©ҙм•” мқјкё° } : л§ҲмқҢмқ„ нҺём•Ҳн•ҳкІҢ н•ҙмЈјлҠ” м„ӨкІҪ(йӣӘжҷҜ), 82. к№ЁлӢ«м§Җ лӘ»н•ҳкі к№ЁлӢ¬м•ҳлӢӨкі н•ҳлҠ” л°”лқјмқҙ мЈ„(мӮ¬лһ‘мқ„ кІғ) лҒқ 25.01.11
- лӢӨмқҢкёҖ{ м„Өлҙү мҠӨлӢҳмқҳ м•Ҳл©ҙм•” мқјкё° } : лҲҲ лӮҙлҰ° кі мҰҲл„үн•ң мӮ°мӮ¬ , 82. к№ЁлӢ«м§Җ лӘ»н•ҳкі к№ЁлӢ¬м•ҳлӢӨкі н•ҳлҠ” л°”лқјмқҙ мЈ„(мӮ¬лһ‘мқ„ кІғ) 3 25.01.09
лҢ“кёҖлӘ©лЎқ
н•ҙнғҲмӢ¬кІҢмӢңлҙүмӮ¬лӢҳмқҳ лҢ“кёҖ
н•ҙнғҲмӢ¬кІҢмӢңлҙүмӮ¬ мһ‘м„ұмқј
{ мҳӨлҠҳмқҳ л¶ҖмІҳлӢҳ л§җм”Җ }
вҖң л§Ҳм№ҳ м–ҙлЁёлӢҲк°Җ лӘ©мҲЁмқ„ кұёкі мҷём•„л“Өмқ„ м•„лҒјл“Ҝмқҙ
мӮҙм•„мһҲлҠ” кІғм—җ лҢҖн•ҙ н•ңлҹү м—ҶлҠ” мһҗ비мӢ¬мқ„ лӮҙлқј вҖқ
<лІ•кө¬кІҪ>
[ м„ мӢң(зҰӘи©©) ]
*** м„қм§Җнҳ„ мҠӨлӢҳмқҳ м„ мӢң집м—җм„ң ( нҳ„м•”мӮ¬)
<к·ёлҢҖлҘј ліҙлӮҙкі >
- мҙҲмқҳ мқҳмҲң
к·ёлҢҖ ліҙлӮҙкі кі к°ң лҸҢлҰ¬лӢҲ лӮ мқҖ м Җл¬ҙлҠ”лҚ° л§ҲмқҢмқҖ м•Ҳк°ң비м—җ м•„л“қнһҲ м –л„Ө мҳӨлҠҳ м•„м№Ё м•Ҳк°ң비 л”°лқј лҙ„л§Ҳм Җ к°Җкі м“ём“ёнһҲ лӮҷнҷ”лҘј л§ҲмЈјн•ҳкі мһ л“ңл„Ө.
з”ЁеүҚйҹ»еҘүе‘Ҳж°ҙдҪҝжІҲе…¬ мҡ©м „мҡҙлҙүм •мҲҳмӮ¬мӢӨкіө
йӣўдҫҶеӣһйҰ–еӨ•йҷҪеӨ© жҖқе…Ҙжҝӣжҝӣз…ҷйӣЁйӮҠ з…ҷйӣЁд»ҠжңқжҳҘдҪөеҺ» жӮ„然з©әе°ҚиҗҪиҠұзң
мқҙлһҳнҡҢмҲҳм„қм–‘мІң мӮ¬мһ…мҡ©лӘҪм—°мҡ°ліҖ м—°мҡ°кёҲмЎ°м¶ҳлі‘кұ° мҙҲм—°кіөлҢҖлқҪнҷ”л©ҙ
=м¶ңм „мҙҲмқҳ집
### мЈј
гҶҚнҡҢмҲҳ(еӣһйҰ–): кі к°ңлҘј лҸҢлҰ¬лӢӨ.
В·лӘҪлӘҪ(жҝӣжҝӣ): 비, кө¬лҰ„, м•Ҳк°ң к°ҷмқҖ кІғмңјлЎң мқён•ҙ лӮ м”Ёк°Җ м№Ём№Ён•ң лӘЁм–‘, м—¬ кё°м„ңлҠ” мЈјкҙҖм Ғмқё мһ‘к°Җмқҳ мӢ¬м •мқ„ м„қм–‘кіј лҢҖмЎ°мӢңмјң к°қкҙҖнҷ”н•ң кІғмқҙлӢӨ.
В·лі‘(дҪө): лҚ”л¶Ҳм–ҙ.
В·мҙҲм—°(жӮ„然): кі м Ғн•ҳкі л§Ҙмқҙ м—ҶлҠ” лӘЁм–‘.
вҖў н•ҙм„Ө
мқҙлі„мқҳ мӢңлЎңм„ңлҠ” м–ҙл””м—җ лӮҙлҶ”лҸ„ л¶ҖлҒ„лҹҪм§Җ м•Ҡмқ„ мһ‘н’ҲмқҙлӢӨ. м „нҺёмқҳ нқҗлҰ„м—җ л¬ҙлҰ¬к°Җ м—Ҷкі кҪғмһҺмқё л“Ҝн•ң л¶Җл“ңлҹ¬мӣҖкіј к°Җлһ‘비мқё л“Ҝн•ң мҠ¬н””мқҙ мҳЁлӢӨ. нҠ№нһҲ 2кө¬ вҖҳмӮ¬мһ…лӘҪлӘҪм—°мҡ°ліҖ(жҖқе…Ҙжҝӣжҝӣз…ҷйӣЁйӮҠ)вҖҷмқҳ вҖҳмһ…вҖҷмқҖ кё°к°Җ м°ЁлӢӨ. мқҙлі„н•ҳлҠ” к·ё мғқк°Ғмқҙ к°Җлһ‘비 м•„л“қн•ң м Җ лҒқм—җ мҠӨлҜём–ҙ л“Өм–ҙк°„лӢӨлҠ” лң»мқҙлӢӨ. м—°мҡ°(з…ҷйӣЁ)мҷҖ лӘҪлӘҪ(жҝӣжҝӣ) ліҖ(йӮҠ)кіј мһ…(е…Ҙ)мқҳ м–ҙмҡёлҰјмқҖ мқҙлі„мқҳ м •мқ„ лӮҳнғҖлӮё к·№м№ҳлқј н• мҲҳ мһҲлӢӨ. к·ёл Үкё°м—җ мҙҲмқҳлҠ” мӢңмҠ№(и©©еғ§)мқҙмҡ”, м„ мҠ№мқҙмҡ”, лӢӨмҠ№(иҢ¶еғ§)мқҙмҡ”, 추мӮ¬(з§ӢеҸІ) к№Җм •нқ¬(йҮ‘жӯЈе–ң)мқҳ м№ңкө¬мҳҖлҚ”лһҖ л§җмқёк°Җ.
лӮҳл¬ҙлҢҖмӣҗліёмЎҙ м§ҖмһҘліҙмӮҙл§Ҳн•ҳмӮҙ
лӮҳл¬ҙм•ҪмӮ¬м—¬лһҳл¶Ҳ
мңӨлі‘мҳҲ н•©мһҘ
м„қмӣҗмҳҒлӢҳмқҳ лҢ“кёҖ
м„қмӣҗмҳҒ мһ‘м„ұмқј
лҲҲмқ„ л– лҸ„ м•„лӢҲ ліҙмқҙкі
лҲҲмқ„ к°җм•„лҸ„ м•„лӢҲ ліҙмқҙлҠ” кІғ
к·ёлҢҖ л“ұ л’Өм—җ кұёлҰ° м»ӨлӢӨлһҖ н•ҳлҠҳмқҖ
мӢӨлҲҲмқ„ лңЁкі м„ңм•ј 비лЎңмҶҢ ліҙмқёлӢ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