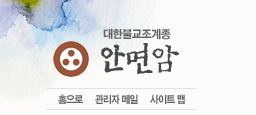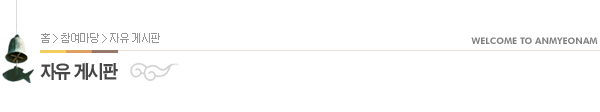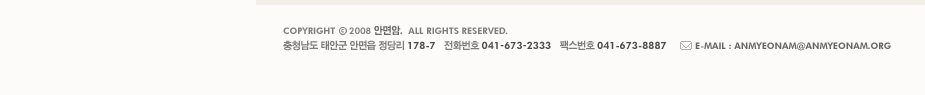설봉스님 { 안면암 일기 } : < 성과 구와 중도 > [석지명 큰스님의 한 권으로 읽는 불교 교리] 중에서 20…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해탈심게시봉사 댓글 7건 조회 3,423회 작성일 21-10-26 06:48본문
<법구경>
277
모든 지어진 것은 덧없는 것이다."
이렇게 지혜로써 깨달은 사람은,
괴로움을 진실로 느끼지 않아
일마다 그 자취를 깨끗이 한다.
아침에 친한 동무가 저녁에 떠나고,
밤에 사랑하던 애인이 아침에 돌아서고,
부모를 잃은 슬픈 눈물이 채 마르기도 전에 형제를 잃는
덧없고 거짓된 이 인생에,
진실을 찾고 항구(恒久)를 바라는 이 마음은 어디서 올까?

015 성과 구와 중도
석존은 정각을 이루기 전에 갖가지의 수행법을 경험했다. 선정주의에 들어가 보기도 하고, 또는 앙상히 뼈만 남은 해골과 같이 될 정도로 몸을 학대하면서 고행에 빠지기도 했었다. 그러고는 도가 고행에 의해서 얻어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석존은 쾌락주의나 고행주의를 피하고 중도로 수행해야 한다고 가르쳤다. 또 석존 당시에는 많은 외도들의 가르침이 있었다. 물건들이 모여져서 세상을 이룬다는 유물론이나, 어떤 신적인 것이 변해서 세상이 되었다는 전변론轉變論같은 것들이 있었다. 죽은 다음에 아무것도 없다는 허무주의, 어떤 형태로든지 삶이 영원히 계속된다는 상주론, 시간과 공간의 끝이 있다거나 없다는 주장 등은 모두 한 변에 치우친 극단적 결정론이었다.
이에 대해서 석존은 양극단을 벗어난 중도의 법을 가르쳤다. 바로 연기법이다. 세상에서의 처신법이나 수행하는 방법으로서 중도를 가르치기도 하고, 존재의 실상을 볼 때 한 변의 극단에 기울지 않는 진리로서의 중도를 가르쳤다. 왜 연기법이 중도의 가르침인가. 쾌락주의와 고행주의의 중간이 중도라거나, 거문고의 줄을 너무 팽팽하게 하지도 않고 너무 늘어지게 하지도 않는 것이 중도라는 것은 이해하기 쉽다. 그러나 공이 성구사상으로 전개되는 연기법이 중도가 된다는 것은 좀 깊이 생각해야 납득될 수 있다.
먼저 이런 물음을 던져 보자. "우리가 죽은 다음에 존재하는 무엇이 있는가 아니면 없는가?" 모든 사물이 연기하는 생태에 있으므로 공하고, 공하므로 서로 무한히 얽혀서 포함해 있다는 석존의 가르침을 염두에 두고 생각하면, 저 질문은 아예 성립되지 못한다. 왜냐. 먼저 "우리가 죽는다."는 전제부터가 틀렸다. "우리"라고 하는 것은 변하는 상태에 있다. 고정된 것이 없는데 고정된 개념으로 묶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라고 이름 붙인 데는, 이미 자의적인 "결정"이 개입되어 있다. 고정된 것이 없이 끊임없이 변하는 상태에 있는 것을 "우리"라는 개념으로 고정시켰기 때문이다. "죽는다."는 개념에도 제멋대로의 결정이 스며 있다.
항상 변하는 과정에 있는 우리가 특별히 산다고 할 것이 없는데, 살아 있다고 기정사실화해서 죽음을 말하기 때문이다. 고정적으로 있지도 않은 "우리" "태어남" "삶" "죽음" 등을 기정사실화해서 답을 만들면 양극단의 결정론이 나온다. 즉 "있다" "없다" 이다. 죽은 다음에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 있다거나, 아무것도 없다는 극단적인 결론을 내리게 된다는 말이다. 그러나 어떤가. 연기하고, 공하고, 포함된 상태에 있는 모든 사물은 한마디로 있다거나 없다고 말할 수가 없다. 끊임없이 변해가는 과정에서 어느 한 순간의 것만을 집어서 최종적인 것으로 말할 수 없다. 판단을 중지해야 한다. 그러므로 연기, 공 , 성구사상은 있다거나 없다는 양극단에 대한 중간 입장, 즉 중도가 되는 것이다.
제자가 석존에게 물었다. "세상이 공간적으로나 시간적으로 끝이 있는가 없는가, 죽은 다음에 존재하는가, 정신과 육체는 하나인가 둘인가?" 석존은 침묵할 수밖에 없었다. 이 질문은 "자기 맘대로의 단정"들로 꽉 차 있었기 때문이다. 만약 저 질문을 상대하면 "세상" "공간" "시간" "정신" "육체" 등을 고정적인 것으로 인정하는 격이 된다.
그래서 침묵만이 가장 적절한 대답이었다. 석존은 침묵으로 있다 없다의 양극단을 피했지만, 뒤의 용수는 달랐다. 용수는 변증법을 써서, 양극단 결정론자들이 자가당착에 빠지게 해서 석존 침묵의 깊은 의미를 설명하려 했다. 연기법이 바로 중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공이나 성구사상에서도 똑같이 중도를 끌어낼 수 있다.
그러나 변하는 상태나 텅 빈 상태에 있음을 강조해서 일반인들이 쓰고 있는 개념을 부정하는 식으로 나아가면, 중도를 이해하고 설명하려는 논리 구조가 좀 복잡하다. 반면에 공을 뒤집은 성구에서 중도를 끌어내보면 연기나 공으로 밝히려는 중도가 좀 더 분명해진다. 삶에도 죽음이 포함되어 있고, 없음에도 있음이 포함되어 있다고 함으로써, 삶이나 죽음, 있음과 없음의 양극단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은 유무의 양극을 부정해야 하기도 하고, 또 중도의 뜻을 전해야 하지만 성구는 양극을 놔둔 채 중도를 드러낼 수 있는 것이다.




댓글목록
해탈심게시봉사님의 댓글
해탈심게시봉사 작성일
<부처님 말씀>
삶은 불확실한 인생의 과정이지만
죽음만은 인생의 매듭이기 때문에
엄숙할 수 밖에 없다.
그대의 삶에는
한두 차례 시행착오가
용납될 수 있지만
추후에는 그럴만한 여유가없다.
그러므로
잘 죽는 일은 바로
잘 사는 일과 직결된다.
- 본생경 -
나무대원본존 지장보살마하살
나무약사여래불
해탈심 합장
원만행님의 댓글
원만행 작성일태양은 누구 어디에나 피추고 미워 하지 않듯 우리마음도 그렇게 훌 련 이 되어야한다 . 부처님의 얼굴은 마음의 평화를 얻은 분의 표정의 업적물 의여락 기쁨 만족 쾌락 무념 조견오온 응작여시관 . 물의 불별성 의 믿음 죽는순간 만족함도알아야한다 .나무아미타불 . 죽음속에 죽음이 없는 진실상 ! ㅡ 만족을 얻어 평화가있다 . ..
해탈심게시봉사님의 댓글의 댓글
해탈심게시봉사 작성일
생기발랄하신 큰보살, 원만행보살님!~
태양은 두두물물頭頭物物
누구에게나 어디에나 비추고 차별하지 않듯
우리 마음도
그렇게 훈련이 될 수 있다면 그 얼마나 기쁠까요?
만족하는 자에게 항상 평화가 따를 것입니다.
댓글 감사 감사드립니다.
나무대원본존 지장보살마하살
나무약사여래불
해탈심 합장
정광월 합장님의 댓글
정광월 합장 작성일
세종 문화회관 전시실
혜담스님 고려 불화전
어제 갔다 왔어요
시간 되시면 갔다 오셔요
단풍이 많이 들었어요
ybr님의 댓글의 댓글
ybr 작성일
참 좋은 도반, 정광월보살님!~
저도 꼭 관람하고 싶었습니다.
세종 문화회관을 한번도 가본 적이 없는 무지한 해탈심이지요.
꼭 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단풍도 보고 싶네요.
댓글 감사 감사드립니다.
나무대원본존 지장보살마하살
나무약사여래불
해탈심 합장
정광월 합장님의 댓글
정광월 합장 작성일
비원도 가 보시고
5호선타고 광화문 내리면
교보도 있고
길 건너 전시관
교보쪽 조계사
해탈심게시봉사님의 댓글의 댓글
해탈심게시봉사 작성일
참 좋은 도반 , 정광월보살님!~
비원 ㅡ 여고생 때 가봤는데 무척이나 감동적인 구중궁궐의 정원이었습니다.
가을이 가기 전에 한번에 몰아서 견학?하면 아주 좋겠네요.
댓글 감사 감사드립니다.
나무대원본존 지장보살마하살
나무약사여래불
해탈심 합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