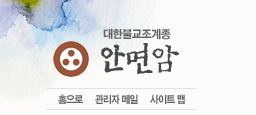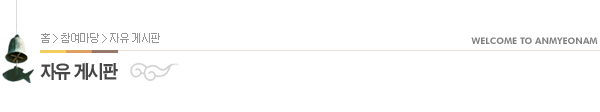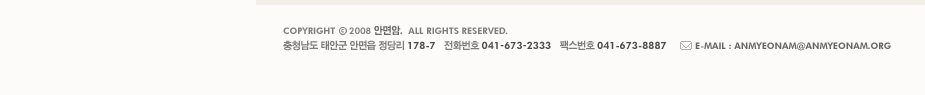“남이 아닌 나의 삶을 살라”
인생을 살다보면 수많은 배역 맡게 돼
주인 되려면 보살도 수행자役 충실해야
眞我, 항상 그대로 있어야 지치지 않아
지명 스님이 제안한 종단 발전 방안
①시대에 부합하는 현실적 계율 마련
②종단 지도자 선출 선거제도 변화
③교리 이해·실천 용이토록 간추려야
④소욕지족 실천 스님들을 조명해야

속리산 산자락에 접어들자 내리던 비가 그쳐서 천지간(天地間)이 맑게 씻은 느낌이었다. 부처님의 가르침(佛法)이 상주(常住)하는 도량답게 조계종 제5교구본사 법주사에는 지나칠 관문이 많았다. ‘호서제일가람(湖西第一伽藍)’이라는 현판이 붙은 산문(山門)과 금강문(金剛門)을 지나서 우람한 위용(威容)의 사천왕상이 지키는 천왕문을 거친 뒤에야 법주사 경내에 닿았다. 천왕문을 지나니 정면으로는 팔상전(八相殿)이, 왼쪽으로는 금동미륵불이 서 있었다. 경내에는 중생이 아무리 닿으려고 해도 닿을 수 없는 천상도(天上道)가 펼쳐져 있었다. 저도 모르게 한 발 물러나 올려다보는 게 숭고미(崇高美)의 본령(本領)이어서 필자는 숙연한 마음으로 팔상전에 참배해야 했다.
팔상전은 한국 최고(最高)이자 최고(最古)의 5층 목탑이다. 벽면에 부처님의 일대기를 그린 팔상도(八相圖)가 그려져 있다.
필자는 거대한 크기의 미륵불로 걸음을 옮겼다. 미륵불을 최초로 조성한 것은 신라의 진표 율사이다. 하지만 흥선대원군이 경복궁을 축조하는 데 소요되는 자금을 마련한다는 구실로 금동미륵대불을 몰수해갔다. 3만여 명의 불자의 원력으로 2002년 금동미륵대불은 다시 조성될 수 있었다.
팔상전의 뒤로 국보 5호인 쌍사자 석등(雙獅子石燈)이 서 있다. 두 마리의 사자가 두 다리로 서고 두 팔로 받치고 있는 것은 8각의 화사석(火舍石)이었다. 그 석등에서 새어나온 불빛이 무명의 세상을 환하게 밝혔을 것이다. 속리산의 법등(法燈)은 천년 동안 꺼지지 않고 혜명(慧命)을 지키고 있었던 것이다.
인생의 주인공이 되려면…
염화실(拈華室)에 다다르니 법주사 조실 허허 지명 대종사가 필자를 반갑게 맞아주었다. 차를 내려서 건넨 뒤 지명 스님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필자가 불자에게 삶의 지남(指南)이 될 말씀을 부탁드리자 지명 스님이 비로소 입을 뗐다.
“‘남이 아닌 나의 삶을 살라’고 당부하고 싶습니다. 지금의 나는 끝없는 과거의 흐름에 의해서 여기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현실의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살아야 합니다. 세상을 살다보면 출세 내지는 성공하라고 부추기는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인생이라는 연극에서 성공하려면 자신이 맡은 배역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인생을 살다보면 수많은 배역이 주어집니다. 가족관계에서는 어려서는 아들딸의 역할을, 젊어서는 부부의 역할을, 늙어서는 부모의 역할을 잘 해야 하고, 사회관계에서는 친구, 직장 동료, 선후배 등 역할을 잘 해야 합니다. 이러한 역할을 잘 소화하려면 우정과 사랑과 신의라는 연기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갓 태어난 부처님께서는 ‘천상이나 지상에서 오직 나 홀로 높다’고 설하셨습니다. 지금 그대로의 나로서 충분하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인생의 주인공이 되려면 실천하기 어려운 보살도 수행자의 배역을 맡아서 충실하게 연기해야 합니다. 진정한 나는 항상 그대로 있어야만 지치지도 않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스님의 말씀은 중국 임제 선사의 ‘수처작주(隨處作主) 입처개진(立處皆眞)’, 즉, ‘머무는 곳마다 주인이 되어라. 지금 서 있는 그 자리가 진리의 세계’라는 가르침을 떠올리게 한다. 스님은 보살도를 실천하는 주인공의 삶에 대해 사람마다 각기 다른 해법을 제시했다. 정치지도자들은 반목과 대립이 아닌 포용과 화합의 지도력이 필요하다는 게 스님의 견해이다.
“정치인들은 나라를 위한다는 점에서 대단한 원력가입니다. 우리는 미국의 트럼프 전 대통령이 기독교 광신도이거나 미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지지자들을 결집하기 위해서 자극적인 말과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정치의식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상대진영의 트집만 잡는 것은 결과적으로 국민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지명 스님은 종단의 후학(後學)들에게는 발심(發心)을 요구했다.
“수행자의 길은 큰 발심이 없는 이에게는 고난의 연속일 것입니다. 발심은 가능한 많은 사람에게 안락을 주겠다는 발원입니다. 참선, 경학, 포교, 염불 기도 중에서 자신의 적성에 맞는 길을 골라야 합니다. 시간가는 줄 모르고 수행에 몰두할 수 있는 근기를 키우면 자연스럽게 불가사의한 부처님의 가피를 체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수행자는 자신의 공부를 점검해야 합니다. 자신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불법을 교화할 수 있는지 현장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돌이켜보건대 ‘진작 보다 깊이 있는 포교 방법을 닦아 둘 걸’하는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불교는 다른 종교와 달리 참선을 중시하는 만큼 명상지도를 활용하거나, 시대변화에 상담심리와 명상지도를 활용하는 것도 포교의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불교와 종단 발전 위한 당부
지명 스님은 불교계가 현대사회에서 해야 할 역할로 네 가지 방법을 제시했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첫째,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계율을 마련해야 한다. 이판승과 사판승이 나눠져 있듯이 채식하는 스님과 육식하는 스님이 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해야 한다. 부처님 재세 당시 수행전통을 지키고 있는 남방불교 수행자들은 육식을 하고 있다. 일본불교도 종파에 따라 다르지만 육식을 허용하고 있다. 계율을 시대에 맞게 정비한다면 국민들로부터 불교계가 손가락질을 받는 일도 줄어들 것이다.
둘째, 종단 지도자를 선출하는 선거제도를 바꿔야 한다. 일정한 자격을 갖춘 후보들을 추천한 뒤 최종적으로 추첨하는 방안도 선거제도의 대안이 될 수 있다.
셋째, 불교의 가르침을 이해하기도 쉽고 실천하기도 쉽게 간추려야 한다. 가령, 불자들이 염불수행을 할 때 관세음보살이나 지장보살을 염송(念誦)하는 데 그치지 않고 보살도 정신의 의미를 숙고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넷째, 스님들이 검소한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 실제로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스님들은 소수이고 다수는 청빈하게 생활하고 있다. 물질적 가난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수행하고 포교하는 스님들을 조명하고, 나아가서는 지족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스님들이 종단의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
스님은 이어 조계종의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우선, 재정이 투명하게 관리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합니다. 조계종의 1년 예산은 대형 교회 1년 예산보다 작습니다. 명산에 위치한 명찰들이 많다 보니 외형적으로만 부유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이미 많은 사찰이 투명하게 재정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누가 봐도 검증 가능한 재정 관리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스님들이 직접 돈을 만지지 않고도 사찰이 운영되는 제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설법과 의례 의식이 국민의 여망에 부응할 수 있도록 쉽고도 간명하게 현대화해야 합니다.”
스님이 제시한 불교계의 개선 방안들은 스님이 수행자로서 살아오면서 몸소 체득한 지혜라고 할 수 있다. 스님은 동진출가한 뒤 은사인 혜정 대종사로부터 수행과 포교가 다르지 않음을 배웠고, 법주사 문도(門徒)로서 금오 대선사의 올곧은 수행정신도 익힐 수 있었다.
“은사스님이 지어주신 제 법명은 지명(智明)입니다. 미욱한 제가 밝은 지혜를 얻길 바라셨던 것이지요. 그런데 제가 수행을 하다 보니 밝은 지혜를 얻는 것보다 중생을 위하는 보살도의 삶을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은사스님께 제 법명을 중생의 고통을 향해 울면서 나아간다는 의미가 담긴 지명(之鳴)으로 바꿔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기실, 불교의 본의(本意)로 보면 진정으로 밝은 지혜는 자비의 보살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은사인 혜정 대종사는 상좌들에게 “참선, 경학, 염불을 막론하고 열심히 수행하면 자동적으로 포교는 잘 된다. 한국불교의 문제점은 수행이 철두철미하지 못해서 비롯되는 것”이라는 가르침을 수시로 강조하였다. 이러한 은사스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지명 스님은 고요한 가운데 깨어 있고 깨어 있는 가운데 고요한 ‘성적등지(惺寂等持)’의 수행을 실천하고자 노력해 왔다.
상좌로서 스님이 회고하는 혜정 대종사의 모습은 자신에게는 칼날처럼 엄격했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무한한 아량을 보여주었던 대기대용(大機大用)의 선지식이었다.
“발심없는 수행은 고난…발심으로 나아가라”
道人 알아보는 법, 사람 섬기는지 확인
해탈 이룬 사람, 저절로 자비심 구현해
방생의 자비 실천하는 사람이 곧 ‘道人’

금오 선사 수행정신 계승 노력
스님은 법주사의 수행가풍에 대해 “행주좌와(行住坐臥) 어묵동정(語默動靜) 중에도 화두를 놓지 않았던 금오 대선사의 수행정신을 계승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금오 대선사께서는 자나 깨나 참선을 강조하셨습니다. 심지어 교리 공부가 참선에 방해가 될 수 있다고 경계하셨습니다. 은산철벽(銀山哲)을 마주한 것 같은 경계까지 나아가는 활구참선을 강조하셨습니다. 금오 대선사는 화두 타파의 궁극적인 목적이 중생에게 회향하는 데 있다고 설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금오 대선사의 가르침을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간단명료하게 문서화하려고 합니다. 금오 대선사의 가르침대로 시대의 아픔을 여실히 관찰하고 그 현실적인 해답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지명 스님의 이력 중 눈길을 끄는 것은 동국대 불교학과 학사, 석사를 졸업하고 박사과정까지 마친 뒤 미국 필라델피아 템플대 종교학과에서 석·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는 사실이다. 필자는 어떤 이유로 미국에 유학하게 되었는지 궁금했다. 이에 대해 묻자 스님은 “견문을 넓히기 위해 미국에 갔다가 영어를 공부하게 되었고, 그러다가 이왕이면 비교종교학을 전공하기로 결심했다”고 대답했다.
스님이 비교 체험한 동국대 불교학과와 미국 필라델피아 템플대 종교학과의 공부는 방식이 사뭇 달랐다. 한국의 공부방식이 산을 직접 등반하면서 경험하는 것이라면, 미국의 공부방식은 드론의 카메라로 내려다봄으로써 산을 파악하는 것이었다.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스님은 인도, 중국, 일본, 독일 등지에서 각기 다른 종교학을 전공한 교수들을 직접 만날 수 있었다. 국적이 각기 다른 교수들은 스님이 수행을 통해 얻게 된 착상(着想)들을 신기하게 생각한 것은 물론이고 학문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격려해줬다.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스님은 급변하는 현대사회에서 부처님 가르침을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 화두를 갖게 되었다.
“우리는 수많은 인공위성들이 지구 위를 돌며 내려다보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공지능이 사람의 역할을 대신하는 것은 물론이고, 사람보다 훨씬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과학기술시대에도 변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욕망의 덫에서 벗어나는 길은 무상의 진리를 깨달아 삼독심(三毒心)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먼저 시시처처에서 마음을 닦아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마음을 닦아서 얻은 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알려야 합니다.”
지명 스님의 저술 중에는 일본의 히사마츠 신이치(久松眞一)와 독일의 마르틴 하이데거(Martin Heidegger)의 무(無) 사상을 비교한 논문이 흥미로웠다. 지명 스님은 이 논문을 쓰게 된 경위를 설명했다.
“히사마츠는 정토교를 비롯해서 심지어 선(禪)마저도 초월하려고 했습니다. 과거 조계종 종정 서옹 예하가 일본에 유학할 때 히사마츠가 지도하는 수선회에 가입했었다고 합니다. 사물을 이해하는 불교적인 방식은 현상학의 기본인 질적 접근 방식과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하이데거는 무와 죽음을 향해 적극적으로 부딪쳐서 무와 죽음을 넘어서려고 노력했습니다. 다시 말해 죽음을 미리 겪어 봄으로써 무 앞에 나타나는 실로 참다운 삶을 회복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불교의 공(空)과 하이데거의 무에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는 필자의 질문에 스님은 잠시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이 질문을 어떻게 쉽게 설명해야 하나’하는 표정이었다.
“서양철학은 ‘존재자’ 내지는 ‘실체’를 전제로 합니다. 주관과 객관을 동시에 보는 ‘현존재’를 밝히는 것이 존재자의 진짜 모습을 밝혀내는 데 유효하다는 데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시종일관 실체를 부정하는 불교의 연기법과는 출발점이나 지향점이 다릅니다. 그런 까닭에 혹자는 불교의 공과 달리 하이데거의 무는 궁극적으로는 존재자의 있음을 확인하는 데 쓰였다고 평합니다. 제 생각에는 동서양의 철학에 다리를 놓는 데 하이데거의 공로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불교는 종교이고 하이데거는 철학자입니다. ‘개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라고 묻자 조주 선사는 처음에는 ‘없다’고 대답했고, 다음에는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방편이 무한한 불교에서 존재자의 유무에 지나치게 집착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십선계 실천하라”
인터뷰를 마치자 스님은 법주사 경내까지 필자를 배웅했다. 팔상전에 이르러서 스님은 법주사의 수행가풍에 대해 간략히 설명했다.
“법주사는 고대로는 진표 율사의 미륵사상과 유식사상이, 근대로는 금오 선사의 수행가풍이 계승돼 온 도량입니다. 안타깝게도 진표 율사와 법상종의 유식사상을 잇는 구체적인 연결 자료는 없습니다. 그래서 법주사에서는 미륵신앙의 실천덕목인 십선계 실천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십선계는 십악의 반대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십선계는 죽이지 않고 살리고, 훔치지 않고 베풀고, 음란한 행동하지 않고 맑게 사는 등 몸으로 실천하는 3선에 진실과 사실만을 말하고, 고운 말을 쓰고, 관계의 화합을 위해 말하는 등 입으로 실천하는 4선에 만족하고, 차분하며, 바른 지혜를 닦는 등 마음으로 실천하는 3선을 합친 것이다.
스님은 십선계 중 첫 번째인 죽이지 않고 살리기에 대해 부연하면서 방생의 의미를 강조했다.
“불교 계율의 첫 번째가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지 않는 것입니다. 불살생의 적극적인 실천이 방생입니다. 방생의 첫 번째 대상은 바로 자신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깨달음의 지혜를 얻어야 합니다. 지혜를 얻어야 해탈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 해탈이 자신의 방생인 것입니다. 방생의 두 번째 대상은 세상입니다. 자신의 해탈을 이룬 사람은 자동적으로 남을 살리는 방생, 즉, 자비를 실천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정한 깨달음을 얻으면 마음속에 아무리 눌러도 막을 수 없는 자비가 솟구쳐 올라옵니다. 도인(道人)을 알아보는 아주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시시처처(時時處處) 만나는 모든 사람을 섬기는지를 보면 됩니다. 상대가 아무리 무례한 행동을 한다고 해도 도인은 온화한 표정을 짓고 상냥하게 말할 것은 물론이고 상대를 존중할 것입니다. 방생의 자비를 실천하는 사람이 바로 도인인 것입니다. 깨닫지 못한 사람도, 자비심이 없는 사람도 방생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방생은 최상의 복을 짓는 일입니다. 자신이 직접 방생하지 못하고, 방생을 찬탄하기만 해도 좋은 일입니다.”
스님의 말을 듣고서야 필자는 스님이 왜 대화 내내 입가에 엷은 미소를 머금고 있었는지 알 것 같았다. 법주사에 주석하였던 조선시대 고승(高僧) 벽암(碧) 스님은 “염송(拈頌)이 30편이요, 새겨진 경전(契經)이 8만 게송이로다. 어찌 뒤섞여 갈등을 일으키겠는가? 웃을만하도다”라는 게송을 남겼으니, 법주사 경내에는 도솔천(兜率天)의 미륵부처님이 미리 내려와 웃고 계시는 것이리라.

유응오 작가 hyunbulnews@hyunbul.com 기자의 다른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