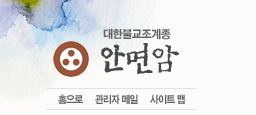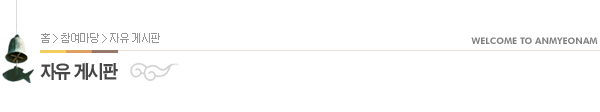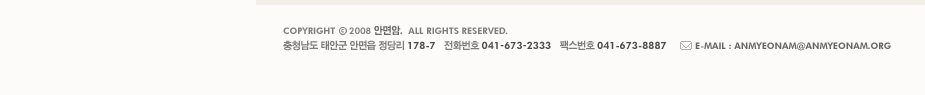설봉스님[안면암 일기] : 100 큰 슬픔의 마음 (2) (화엄경7) 2022년 11월 16일 水(수)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해탈심게시봉사 댓글 3건 조회 176회 작성일 22-11-16 12:59본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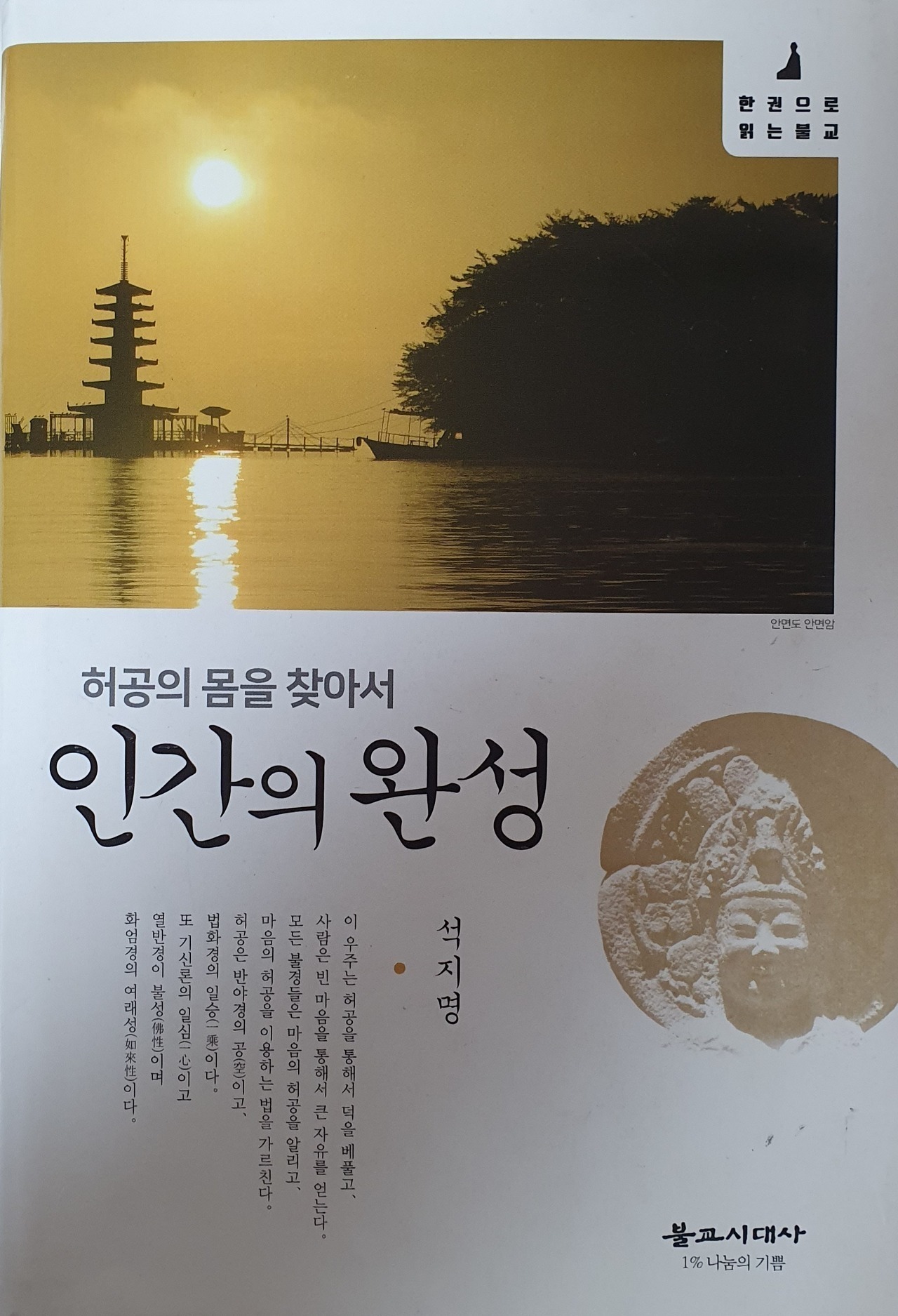
100
큰 슬픔의 마음 (2)
(화엄경 7)
업의 바다 속을 중생들은 계속 오고 간다.
그러나 행인들은 그것을 알지 못한다.
보살에게 있어서 비로자나불을 알지 못하는 것은 큰 슬픔이다.
목포행 비행기 사고에서 부모를 잃은 철없는 어린이를 보는 것과 같은 슬픔이 있다. 업의 바다를 보는 이는 부처나 보살이나 우리를 막론하고 누구에게난 큰 슬픔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다. 이 슬픔의 마음은 슬픔인 동시에 동생을 돕고자 하는 연민의 마음이다. 우리가 이 큰 슬픔의 마음, 깨달음의 도를 찾아서 중생을 위하고자 하는 마음을 눈치채지l 못하고 그냥 지나치면 화엄경을 제대로 읽지 못하는 것이 된다. 불교사상에 기반을 둔 모든 시와 이야기들은 이 큰 슬픔의 마음을 바닥에 깔고 있다.
만해 한용운 스님의 시집 님의 침묵 중에서 ‘알 수 없어요’라는 시를 읽고 큰 슬픔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보도록 하자.
바람도 없는 공중에 수직의 파문을 내이며 고요히 떨어지는 오동잎은 누구의 발자취입니까?
지리한 장마 끝에 서풍에 몰려가는 무서운 검은 구름의 터진 틈으로 언뜻언뜻 보이는 푸른 하늘은 누구의 얼굴입니까? 끝도 없는 깊은 나무에 푸른 이끼를 거쳐서 옛 탑 위의 고요한 하늘을 스치는 알 수 없는 향기는 누구의 입김입니까?
근원은 알지도 못할 곳에서 나서 돌부리를 울리고 가늘게 흐르는 작은 시내는 굽이굽이 누구의 노래입니까?
연꽃같은 발꿈치로 가이없는 바다를 밟고 옥 같은 손으로 끝없는 하늘을 만지면서 떨어지는 날을 곱게 단장하는 저녁놀은 누구의 시입니까?
타고 남은 재가 다시 기름이 됩니다. 그칠 줄 모르고 타는 나의 가슴은 누구의 밤을 지키는 약한 등불입니까?
이 시의 제목이 ‘알 수 없어요’이고 각 구절마다 물음표를 하고 있다. 각 물음표마다 알 수 없다는 뜻이다. 알 수 없는 것은 먼저 발자취로부터 시작해서 얼굴 입김 노래 시 약한 등불의 순으로 이어진다. 누구의 발자취인지, 누구의 얼굴인지, 누구의 입김인지, 누구의 노래인지, 누구의 시인지 알 수가 없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약한 등불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알 수 없다는 줄거리이다.
ㅡ 죄송합니다만, 내일 또 이어 게시봉사하겠습니다.
댓글목록
해탈심게시봉사님의 댓글
해탈심게시봉사 작성일
< 오늘의 부처님 말씀 >
“사람들은 흔히 깨끗하고 더러움에 차별을 둔다
그러나 사물의 본성은
깨끗한 것도 더러운 것도 없다
우리 마음이 집착하기 때문에
깨끗한 것을 가까이 하고
더러운 것을 멀리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집착하는 마음,
편견을 떠나면
모든 존재는 깨끗하다.”
ㅡ 대품반야경
< 아차산에 올라 > / 장진규
눈 깜짝할 새에 도착한 아차산역을
하마터면 그냥 지나칠 뻔했다
배낭 속에 준비한 맛있는 음식도
하마터면 차에 두고 내릴 뻔했다
아차산 가는 등산로가 하도 예뻐서
하마터면 길을 잃을 뻔했다
탁 트인 산에 올라 한강 바라보니
덧없는 인생이 주마등처럼 흐른다
아차 하는 순간 놓칠 수 있었던
나의 소중한 일상들까지.
나무대원본존 지장보살마하살
나무약사여래불
해탈심 합장
해탈심게시봉사님의 댓글
해탈심게시봉사 작성일
어머나!
실수로 큰 슬픔의 마음 2를 올렸습니다.
나중에 제대로 다시 올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해탈심 합장
정광월 합장님의 댓글
정광월 합장 작성일
영화사.아차산 가 보고 싶어요
아차 빌려 시 쓰셨네요
월주 대종사님 주석 하시던 영화사
원행 전 총무원장 큰스님 상좌분
동네절 청년법회 지도 하셨는데...
원행 큰스님 오셨는데
은사 스님 뵙지 못하더라고요
조심스러워
착해 보인 스님
어린이 포교 토요일 교육시간
군 복무 스님
도영 금산사 회주스님 상좌
대전 포교당 어린이 포교 담당
금산사
큰스님들께선 다 자상하신 분
도영.성우.원행 큰스님
고 월주 대종사님은 생전 못 뵈었어요
조계사 건너 지하서점 향전에서
열반하시고 큰 사진집
태공
지난 화요일 향전에서의
관조 큰스님 작품 사진집
남대문 생강젤리 사고 집에 오기 가
조계사 마당 앉아 있다 왔어요
하늘의 구름 모양
오교수 서운
정광월 합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