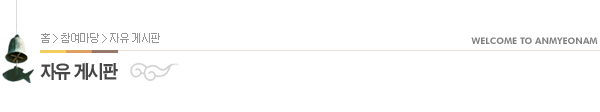설봉스님 { 안면암 일기 } : < 인간의 완성 > 첫째 마당, 맑고 밝고 간결한 부처님의 체취 2022년…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해탈심게시봉사 댓글 4건 조회 605회 작성일 22-02-26 07:42본문
{ 법구경 }
397
세상에 구하는 욕심을 끊고
그 뜻을 함부로 놀리지 않아
모든 두려움을 떠난 사람,
나는 그를 '바라문'이라 한다.
'행복아, 나의 발꿈치를 따라와. 나는 진리를 쭞아가련다.'
비록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해 보았으나, 또 다른 마음 한구석에는 어딘가 생활의 공포가 깃들여 있다.
오늘이라도 내게 만일 세간의 명문(名問) · 이양(利養)의 큰 복덩이가 떨어진다면 나는 떡 조각을 반기는 창살 안의 원숭이 모양으로 진리도, 양심도 원수처럼 버릴 수 있겠는가?


내가 모든 이를 이롭게 할 마음을 내는
일은 어머니도 할 수 없고 아버지도 할 수 없다.
그 어떤 친지도 할 수 없다.
오직 바르게 인도하는 나만이 할 수 있다
<법구경>
자녀가 있는 이는 자녀로 인해 근심하고
소를 가진 이는 소 때문에 걱정한다
사람들이 집착하는 것은 마침내 근심이 된다
집착할 것이 없는 사람은 근심할 것도 없다
<숫타니파타>
#################################################
1
팔리어본과 범어본의 법구경
(법구경 1)
법구경은 단순히 편안해지는 마음가짐이나 행동거지를 갖게 함으로써
모든 이론을 떠나 실천하게 만든다.
원시경전을 보면 팔리어 한문번역본과 범어 한문번역본의 차이에 대한 문제가 생기므로 팔리어와 범어에 대해서 살펴보자.
그리고 《법구경法句經》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고 법구경의 예문도 보도록 하자. 《 법구경》 자체에 대한 지식을 얻는 데 있어서 경 이름의 뜻, 경의 종류, 경의 원본, 경의 대체적 내용을 간추리고 교리적으로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아야 하겠다.
어느 경이고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지만 이 글에서 세우는 체제의 교리와 관계되는 경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다루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다.
지금 원시경전의 하나인 《법구경》에 대해서 처음 살펴야 하는데 원시경전을 보면 팔리어본 경전과 범어본 경전이 나온다. 그래서 팔리어와 범어, 이 두 언어와 불경과의 관계에 대해 간략히 생각해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다.
현재의 팔리어가 남방불교의 성전용어가 되기까지 2천여 년의 세월을 거치면서 많은 발전단계를 거쳤으리라고 추측된다.
팔리라는 말은 본래 선이나 규정의 뜻이었지만 성전이라는 뜻으로 변했다. 팔리어의 원형을 따지는 문제는 부처님 열반 후, 제1회 결집 당시에 어떤 언어를 사용했느냐의 문제와 관계가 있다.
제1회 결집 당시에는 마가다국이 강국이었으므로 마가다국의 방언을 팔리어 원형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 결집 당시보다 약 100년 전에 세력이 있었던 코살라국의 방언도 팔리어 원형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인도의 어떤 방언에서 유래되었든 상관없이 팔리어가 처음부터 현재의 형태로 다듬어진 것은 아니고 많은 단계의 변화와 발전을 겪어 왔다.
인도방언 중의 하나가 불교성전어로 된 이 팔리어는 범어에 비하여 음조가 적고 문법도 간단하다.
범어는 고대인도의 표준 문장어이다. 범어도 높은 언어와 속스러운 언어로 나뉘는데 높은 언어는 삼스크리타이고 속어는 프리크리타이다. 인도유럽의 대부분 언어들이 이 범어에 뿌리를 두고 있다. 범어라고 하는 것은 인도의 조물신(造物神)인 범천이 만든 말이라는 데서 생긴 것이다. 한 비범한 시인이 이 범어를 사용하여 기록한 것이 베다이다. 기원전 4세기경에 범어 문법학자인 파니니가 당시 지식계급의 언어를 기초로 문법책을 만들었다. 파니니에 의해서 범어의 문법이 자리를 굳힘에 따라 이 범어가 종교 · 철학 · 문학의 용어로 사용되어 왔다. 범어라고 하더라도 문법이 체계화되기 이전의 베다어롸 문법이 체계화된 이후의 산스크리트어로 구분된다.
한편, 인도의 민간인들 사이에 속어였던 프리크리타어로부터 여러 종류의 방언들이 나왔는데 팔리어로 그 중에 하나이다. 현재의 힌두어도 프리크리타어에 그 기원을 두고 있다. 불교경전도 처음에는 인도의 각 지방에서 사용되던 방언에 의해 기록되었다.
팔리어도 처음에는 방언 중의 하나였으나 차츰 불경을 기록하는데 주로 쓰여 졌다. 범어로 불경이 쓰여 진 것은 부파불교시대부터였고 설일체유부(說一切有部)에서 경전을 범어로 쓰기 시작한 것이다.
인도의 방언들로 기록되어 있던 경전들도 인도의 표준어로 간주되는 범어로 옮겨지게 되었다.
그런데 이 범어 삼스크리트라는 순수한 범어와 프라크리타라는 일반인 사용의 범어로 나누어지기 때문에 대승불교 경전 가운데 어떤 것은 순수한 고정 범어로 기록되고 어떤 것은 대중이 사용하는 혼합 속어인 범어로 기록되었다.
대체로 초기의 경전은 고전 범어로, 시대가 뒤로 가면서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범어로 쓰여 졌다.
《법구경》의 팔리어 이름은 담마파다이다. '담마'는 진리를 뜻하고, '파다'는 길을 나타낸다. 합하면 '진리의 길', '진리로 가는 길'이 되겠다. 진리를 '법'이라는 말로, '길'을 구절이라는 말로 번역해서 《법구경》이 되었다.
《법구경》에는 크게 두 가지의 계통이 있는데 그것은 팔리어본과 범어본이다.
첫째, 팔리어본은 남방 5부 아함 중에서 소부의 15개 경 중에 있는 하나이다. 이 팔리어본 《법구경》은 두 가지가 있다.
《법구경》 과 《법구비유경》 이다. 《법구경》은 423개의 짧은 게송으로만 되어 있고, 《 법구비유경》은 그 게송에 인연비유담을 주석적으로 첨가한 것이다. 게송으로만 되어 있는 《 법구경》은 제1회 결집 당시의 원형이 보다 많이 보존된 것으로 여겨지고, 《 법구비유경》은 후세에 이루어진 것으로 짐작된다.
이 팔리어본의 《 법구경》과 《 법구비유경》은 한문으로 번역되어 있다. 단지 팔리어본과 한문본이 일치하지는 않는다. 팔리어본에 없는 것이 한문본에 첨가된 것도 있고 또 위치가 옮겨진 것도 있다.
둘째, 범어 계통의 것으로는 <우다나바르>가 즉 <우다나품>이 있다. 이것은 부파불교의 설일체유부 계통에서 사용하던 것인데 《 법구경》과 같은 내용이다. 이것은 티벳어로도 번역되었고 한문으로는 《 법집요송경法集要頌經》으로 번역되어 있다.
팔리어의 '담마파다'를 범어로 표현하면 '우다나'가 된다. 한문으로는 '출요出要'이다. 직역을 하면 '나감을 비추는 것'이 되겠는데 의역을 해본다면 '윤회의 세계로부터 벗어나는 길을 비추는 것'쯤이 될 것이다. 팔리어본 《 법구경》과 마찬가지로 범어본도 게송으로만 된 것은 법집요송경으로 불리고 인연비유담이 붙은 것은 출요경이 되었다. 한문으로 된 출요경에 해당되는 것이 티벳어본에도 있는 것으로 보아 같은 범어 원본에서 한문본과 티벳어본이 생긴 것으로 짐작된다.
이 《 법구경》은 세계 각국의 현대 언어로 번역된 중요한 경전 중의 하나이다. 한글을 비롯해서 영어 · 불어 · 독일어 · 이태리어 ·러시아어 · 일본어 등으로 여러 차례 번역되었다. 한글로 번역된 것 가운데는 한문 《법구경》에서 번역된 것, 일어판에서 이중 번역된 것, 영어판에서 이중 번역된 것, 팔리어로부터 번역된 것이 있다.
이 가운데 가장 최근에 번역된 《 법구경》으로는 한국에서 참선공부를 하다가 남방에 가서 10여 년 수행하며 팔리어를 익힌 거해스님이 번역한 것이다. 이 《 법구경》은 부피가 큰 두 권으로 되어 있다. 거해스님은 그 책의 제목을 이라고 했지만 그 책에는 게송만 담겨 있는 것이 아니고 인연비유담까지 삽입되어 있다.
그래서 정확히 표현하자면《법구비유경》을 펴낸 셈이 된다.
이 인연비유담들은 법구들을 감동적으로 받아들이게 하는 데 큰 효력을 나타낸다. 그리고 이 책이 팔리어로부터 직접 한글로 옮겨진 것이라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지금까지 많은 번역의 과정을 거치면서 의미가 굴절된 위험을 안고 있는 《법구경》을 보았다. 마가다어 또는 다른 인도방언에서 팔리어로, 팔리어에서 범어로, 범어에서 한문으로, 한문에서 한글로 번역된 것을 읽어 보았기 때문이다.
《법구경》은 석가모니부처님 재세시의 환경과 경우에 따라서 또 출가한 제자들의 근기에 따라서 설한 것이다. 그 내용은 극히 간결하고 청초하면서도 종교적이고 도덕적인 향취를 물씬 풍기고 있다.
불교인으로서의 구도자세와 정신을 함양하는 데 기본적 경전인 것이다. 사성제 · 삼섭인 · 십이인연이 수학의 공식이라고 한다면 이 《법구경》에 나오는 내용은 공식을 표면에 내세우지 않고 그 공식이 목표하는 바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어떤 이론을 내세워서 고통이 일어나는 원인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편안해지는 마음가짐이나 행동거지를 갖게 함으로써 모든 이론을 쉬면서도 실천하게 만드는 것이다.
댓글목록
해탈심게시봉사님의 댓글
해탈심게시봉사 작성일
< 오늘의 부처님 말씀 >
"가엾이 여기는 마음은 뿌리가 되고 상냥한 말씨는 줄기가 되고
참는 마음 너울너울 가지가 되고 보시는 주렁주렁 열매가 된다."
ㅡ 대장부론
< 연리지連理枝 > / 김해자
개심사開心寺 오르는 길
마음의 허물 뒤집어쓴 채 세심동洗心洞을 막 지나는데
백주대낮에 소나무 두 그루 얽혀 있다.
한 놈이 한 놈의 허벅지에 다리를 척 걸친 채
한몸이 되어 있다 가만히 보니 결가부좌 튼
부처같기도 한데 육감적인 아랫도리 위에서
어쨌거나 잔가지들은 연락의 기지개 맘껏 켜고 있다
오른 가지는 왼편으로 왼 가지는 오른편으로
우향좌, 좌향우, 전 방향으로 팔을 뻗고 있다.
다리가 하나뿐인 나무처럼 모자란 이 몸이
개심을 하는 길은 먼저 몸을 열어야 한다는 것을
내 안에 갇혀 어두운 내가 밝아지는 길은
하나인 내가 다른 하나의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둘이면서 하나이고 하나이면서 둘인 목불木佛이
앞서 열어 보이고 있다.
나무대원본존 지장보살마하살
나무약사여래불
해탈심 합장
해탈심게시봉사님의 댓글
해탈심게시봉사 작성일
어제 저 혼자의 힘으로
왠만큼 컴의 문제가 해결된 줄 알고 잠이 들었습니다.
토요일이라 평소보다 늦게 기상했는데
아직도 엉망이여 저의 무지를 절감하고
부족한 대로 게시봉사하였습니다.
미진한 곳은 다시 고치겠으니
불편하시지만 넓은 아량으로 읽어 주시기를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나무대원본존 지장보살마하살
나무약사여래불
해탈심 합장
ㅇㄷ님의 댓글
ㅇㄷ 작성일
집착하지 않는 삶을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떤 이론을 내세워서 고통이 일어나는 원인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편안해지는 마음가짐이나 행동거지를 갖게 함으로써
모든 이론을 쉬면서도 실천하게 만드는 것이다.
해탈심게시봉사님의 댓글의 댓글
해탈심게시봉사 작성일
ㅇㄷ님!
그 어느 곳에도 집착하지 않는 삶을
열심히 살고 있다면
인간의 반 이상은 완성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중한 댓글 감사 감사합니다.